[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기를 바랍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꼽 참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소리를 으레 들었습니다. 누가 알아본다고 힘을 그렇게 들이느냐고 핀잔하더군요. 지스러기 같은 일은 지나가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찮거나 하잘것없는 일이란 없을 텐데요. 길미가 된다고 여길 적에만 손을 댄다면, 조그마한 일에는 시들하다면,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해서 볼것없다고 넘긴다면, 아무래도 우리 마음은 물거품에 마병으로 가득하리라 느낍니다. 눈꼽 같다고 여겨 꼽을 주는 말이나 짓을 일삼는 분이 있더군요. 그분한테는 그저 구정물이나 버림치로 보였겠구나 싶어요. 자갈밭이 풀밭으로 거듭나고, 나무씨앗 한 톨이 깃들어 천천히 자라면서, 어느새 숲으로 바뀌기까지는 적잖이 걸릴 테지만, 틀림없이 돌밭도 숲밭으로 피어날 만합니다. 자잘하다고 여겨서 등을 돌리기에 돌더미가 그냥 돌더미로 남습니다. 못할 일이란 없어요. 덧없는 일도 없어요. 누구는 같잖게 볼 테지만, 둘레에서 크잖게 보든 말든 우리가 품고 심어서 가꾸는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다듬읽기 26 《내게도 돌아갈 곳이 생겼다》 노나리 책나물 2021.8.31. 《내게도 돌아갈 곳이 생겼다》(노나리, 책나물, 2021)는 경북 울진이라는 마을을 새록새록 돌아보는 발걸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울진을 ‘울진사람’ 눈길이 아닌 ‘이웃사람’ 눈길로 보고 느끼고 헤아리는 줄거리인데, 조금 더 느슨하고 느긋하고 느리게 맞이하고 녹이고 품으면 퍽 달랐을 텐데 싶더군요. ‘한 해’ 동안 누린 발걸음으로도 얼마든지 글을 여밀 만하고, 엄마아빠랑 할머니가 발붙이는 터를 되새기는 마음으로도 글을 쓸 만합니다만, 서울(도시)뿐 아니라 시골도 ‘한해살이’로는 겉훑기로 그치게 마련입니다. 네철을 바라보았다는 대목은 대견하되, ‘네철을 네 해쯤’ 마주해 보아야 비로소 철빛 언저리를 건드릴 만하고, ‘네철을 네 해씩’ 네 판을, 그러니까 ‘열여섯 해’를 녹여낸다면 누구나 눈뜰 만한데, 적어도 ‘열 해(들숲이 바뀌는 길)’를 들여다보아야 고을맛도 마을빛도 하나하나 노래할 만하다고 봅니다. 서두르는 글은 으레 섣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입니다. ㅅㄴㄹ 그렇게 막무가내로 울진 여행을 시작했다 → 그렇게 무턱대로 울진 나들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다듬읽기 25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재철 홍성사 1995.8.5.첫/2021.1.26.고침2판)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이재철, 홍성사, 2021)는 아버지란 자리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줄거리를 풀어냅니다만, 곰곰이 읽자니 ‘아이돌봄’은 짝꿍인 어머니가 도맡아서 했군요. 이따금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켜본 삶을 글로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웬만한 책은 ‘돌봄글(육아일기)’이 아닌 ‘구경글(관찰일기)’에 머뭅니다. 바쁜 틈을 쪼개어 한동안 조금 놀아 주었기에 어버이나 아버지일 수 없어요. 이러다 보니 ‘아이한테서 배우는’ 길을 제대로 못 누립니다. 누구‘한테서’ 배운다고 하지요. ‘한테(에게) 배우는’이 아닙니다. ‘한테서’ 배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씨 하나로 여긴다면, 그만큼 더더욱 아이 곁에 서지 못 한다는 뜻이요, 아주 작은 말씨 하나부터 추스르려는 마음이라면, 스스로 무엇을 복판에 놓고서 아이 곁에서 보금자리를 일굴 적에 비로소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지요. 놀이터(유원지)에 가야 놀이일 수 없습니다. ㅅㄴㄹ 하나님께서 제게 첫 아들을 주신 것은, 제가 우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우리 말을 죽이는 외마디 한자말 : 강 江 강 상류 → 내 위쪽 / 윗물 강이 흐르다 → 내가 흐르다 강을 건너다 → 내를 건너다 강이 범람하다 → 가람이 넘치다 강을 따라 기암절벽이 펼쳐졌다 → 물을 따라 벼랑이 나온다 ‘강(江)’은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를 가리킨다지요. ‘가람’이나 ‘내·냇물’이나 ‘물·물길·물줄기’로 손질합니다. ㅅㄴㄹ 별들도 강물 위에 몸을 던졌다 → 별도 냇물에 몸을 던졌다 《새벽편지》(정호승, 민음사, 1987) 13쪽 뉴잉글랜드의 강에 투신자살 했다 → 뉴잉글랜드 냇물에 뛰어들었다 → 뉴잉글랜드 냇물에 몸을 던졌다 《가버린 부르조아 세계》(나딘 고디머/이상화 옮김, 창작과비평사, 1988) 148쪽 강 위에 살얼음이 깔리고 → 냇물에 살얼음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 병원 病院 병원에 입원하다 → 돌봄터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 다친이를 얼른 보살핌터로 옮겼다 ‘병원(病院)’은 “1. 병자(病者)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2. [의학] 3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 기관. 의원보다 크다”처럼 뜻풀이를 하는데, ‘돌봄집·돌봄터’나 ‘돌봄울·돌봄울타리’라 할 만합니다. ‘보살핌집·보살핌터’나 ‘보살핌울·보살핌울타리’라 해도 어울려요. 이밖에 낱말책에 한자말 ‘병원’을 둘 더 싣지만 다 털어냅니다. ㅅㄴㄹ 병원(兵員) : [군사] 군대의 인원. 또는 그 숫자 = 병력 병원(病原/病源) : 1. [의학] 병이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 = 병근 2. [보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 세계 世界 세계 10대 수수께끼 → 온누리 열 수수께끼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 → 온누리 으뜸 돈나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 온누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남성 세계 → 사내판 / 사내밭 학자들의 세계 → 먹물나라 동물의 세계 → 짐승누리 / 짐승나라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 마음밭과 살림밭 작품 세계 → 글밭 / 글나라 천상의 세계 → 하늘나라 / 하늘누리 ‘세계(世界)’는 “1.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회 전체 2. 집단적 범위를 지닌 특정 사회나 영역 3. 대상이나 현상의 모든 범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누리·나라’나 ‘온누리·온나라·온곳·온쪽·온터·온땅’으로 담아낼 만하고, ‘마당·판·자리·곳·데·밭·바닥·녘’이나 ‘터·터전·마을’이나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 계단 階段 계단을 내려가다 → 섬돌을 내려가다 계단을 오르다 → 디딤돌을 오르다 최후의 한 계단을 오르지 못해 → 마지막 한 칸을 오르지 못해 몇 계단 내려오다가 → 몇 다락 내려오다가 ‘계단(階段)’은 “1.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 ≒ 계서 2.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밟아 거쳐야 할 차례나 순서 3.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의 낱낱의 단을 세는 단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섬·섬돌·돌’이나 ‘길·길눈·길꽃’으로 손봅니다. ‘다락·판·자리’나 ‘디디다·디딤·딛다’로 손본고, ‘디딤널·디딤판·디딤돌·디딤길·디딤칸’이나 ‘발판·칸·켜’로 손보면 되어요. 이밖에 낱말책에 한자말 ‘계단’을 넷 더 싣는데 다 털어냅니다. ㅅ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말 좀 생각합시다’는 우리를 둘러싼 숱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더 쓰면 한결 즐거우면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나고 사랑스레 말빛을 살리거나 가꿀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 좀 생각합시다 45 나가는곳 일본 쇳길(전철)에는 언제부터 한글을 나란히 적었을까요? 일본 쇳길에 적힌 한글이 익숙한 분은 예전부터 그러려니 여길 수 있고, 퍽 오랜만이나 처음으로 일본마실을 한 분이라면 새삼스럽다고 여길 수 있어요. 모든 나루에 한글이 적히지는 않습니다만, 큰나루는 어김없이 한글을 적습니다. 나루이름을 한글로 적고, ‘나가는곳’이라는 글씨를 함께 적더군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루에 ‘나가는곳·들어오는곳’을 적습니다. 곁들여 한자로 ‘出口·入口’를 적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말이요, 무엇이 일본말일까요? 바로 ‘나가는곳·들어오는곳’이 우리말이요, ‘出口·入口’가 일본말입니다. ‘出口·入口’를 한글로 옮긴 ‘출구·입구’는 우리말일까요? 아닙니다. 일본 한자말을 한글로 옮겼을 뿐입니다. 국립국어원 낱말책을 보면 ‘출구(出口)’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 ‘나가는 곳’, ‘날목’으로 순화”로 풀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81. 철바보 어릴 적 어머니가 문득 읊은 ‘철부지’란 낱말이 어려워 “어머니, 철부지가 뭐예요?” 하고 여쭈었더니 “철부지? 어려운 말인가? 철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야. 철딱서니없다는 뜻이지.” 하고 부드러이 알려주었다. 우리말로 “모르는 사람 = 바보”이다. 그러면 ‘철바보’처럼 처음부터 쉽게 이름을 붙이면 어린이도 어른도 다들 쉽게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펼 만하리라. 철바보 (철 + 바보) : 철을 모르거나 잊거나 살피지 않거나 느끼지 않는 사람. 철이 들지 않은 사람. (= 코흘리개. ← 철부지-不知, 삼척동자, 무지無知, 무지몽매, 지각知覺 없다, 불효, 불효막심, 불효자, 불효녀, 불효자식) 82. 큰가작 어린이 눈으로 바라보는 길이란, ‘눈높이 낮추기’가 아닌 ‘눈높이 넓히기’이다. 몇몇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말을 치우고서, 누구나 알아보면서 삶을 북돋우고 빛내어 가꾸는 길을 열려는 마음이라면 ‘어린이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말을 편다’고 느낀다. 밥집에 간 아이들이 차림판에 적힌 ‘대중소’란 글씨를 보며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둘레 어른은 으레 “큰 것하고 중간 것하고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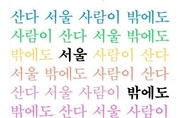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54 《서울 밖에도 사람이 산다》 히니 이르비치 2023.10.27. 《서울 밖에도 사람이 산다》(히니, 이르비치, 2023)를 읽고서 한참 자리맡에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서울·서울곁·서울밖’ 셋으로 가르는 담벼락이 높은데, ‘서울밖’ 다음으로 ‘시골·두메·섬’으로 더 가르곤 합니다. 곰곰이 보면 ‘서울곁’도 다 다릅니다. ‘고양’보다 ‘일산’이라는 이름이 드높은 고장은 ‘서울곁·서울밖’이어도 굳이 서울바라기를 안 한다고 느껴요. ‘성남’보다 ‘분당’이라는 이름이 높은 고장도 구태여 서울바라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천과 인천은 ‘서울곁’이어도 ‘서울밖’에 가깝습니다. 남양주나 의정부나 구리는 어떨까요? 적잖은 ‘서울곁’조차 ‘서울밖’이기 일쑤요, 여러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온통 ‘서울나라’인 터라, ‘서울로(인 서울)’를 이루지 못 하면 찬밥처럼 여겨요. 그렇다면 왜 ‘서울·서울곁·서울밖’ 같은 굴레가 생길는지 생각할 노릇입니다. 서울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부터 ‘시골·두메·섬’을 밑에 깔더군요. 서울곁으로 가지 못 하더라도 시골이나 두메나 섬으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