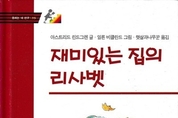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푸른책 읽기 53 《재미있는 집의 리사벳》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일론 비클란드 그림 햇살과나무꾼 옮김 논장 2003.10.15. 《재미있는 집의 리사벳》(아스트리드 린드그렌/햇살과나무꾼 옮김, 논장, 2003)은 나중에 《리사벳이 콧구멍에 완두콩을 넣었어요》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옵니다. 리사벳하고 마디켄 두 아이가 보내는 하루를 가만히 들려주는 줄거리입니다. 모든 나날이 놀이인 아이들 삶을 보여주고, 동무를 헤아리는 마음을 밝힙니다. 스스로 생각을 짓는 길을 알려주고, 꿈으로 나아가는 새빛을 속삭입니다. 예전에는 배움터에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아이들이 들숲바다를 스스로 품으면서 뛰놀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배움터가 선 지는 이제 고작 온해(100년)입니다. 참말로 아이들은 어버이랑 마을 어른한테서 배웠어요. 책이 아닌 삶을 배웠고, 부스러기가 아닌 살림짓기를 배웠습니다. 돈으로 밥옷집을 사다 쓰는 틀이 아니라, 손수 밥옷집을 지어서 스스럼없이 이웃하고 나누는 살림새를 배웠어요. 《리사벳》에는 천천히 자라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 집안은 그다지 가멸다고 여기기 어렵습니다. 어느 아이는 무척 가난합니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짓는 글살림 46. 길을 찾는 글 우리가 쓰는 말을 곰곰이 보면 ‘씨’라는 낱말이 곧잘 붙습니다. ‘씨나락·씨암탉·씨돼지’처럼 쓰고, ‘씨알·씨주머니·씨물’처럼 쓰며, ‘솜씨·마음씨’처럼 씁니다. ‘맵시’도 ‘씨’하고 얽히는 낱말이지만 글로는 ‘시’로 적되 말로는 ‘씨’로 소리를 냅니다. ‘씨’하고 ‘시’는 오가는 사이예요. ‘씨앗’하고 ‘시앗’은 말밑이 같습니다. 어느 고장에서는 겹닿소리를 쓰고, 어느 고을에서는 홀닿소리를 쓸 뿐입니다. 이 ‘씨’라는 말을 넣어 ‘이름씨·그림씨·움직씨·어찌씨·셈씨’ 같은 낱말을 짓기도 합니다. 영어를 한자로 옮긴 일본 말씨인 ‘명사·형용사·동사·부사·수사’가 아닌, 우리 나름대로 이 삶자락을 헤아려서 우리말을 찬찬히 쓰자는 뜻으로 지은 낱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말로만 쓰자고 얘기하거나 외우도록 하는 일이든, 꽤 오래 익숙하게 쓰거나 자리잡은 일본 한자말을 그냥 쓰자고 뒷짐지는 일이든, 그리 알맞지 않다고 여깁니다. 말밑을 차근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기를 바랍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지긋하다 지난날 쓰던 말을 오늘날 모두 되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새 새롭게 쓰는 말씨를 구태여 안 버려도 됩니다. 그저 하나를 알아보면 되어요. 새롭게 쓰는 말도 ‘새말’이고, 오래오래 잊다가 다시 쓰는 옛말도 ‘새말’입니다. 갓 나와서 새책집에 꽂혀도 ‘새책’이고, 이때껏 모르고 살았으나 헌책집 시렁에서 비로소 만나 처음으로 들추어도 ‘새책’입니다. 둘레에서 ‘자동차·카’ 같은 한자말하고 영어를 흔히 쓰면, 저는 우리말 ‘수레’를 슬쩍 곁들입니다. 우리 발걸음을 헤아려 ‘짐수레’를 ‘화물차·트럭’을 풀어내는 낱말로 삼을 만해요. ‘양말·삭스’가 넘실거려도 문득 우리말 ‘버선’을 보탭니다. 지긋지긋하다면 지겹다는 뜻이지만, 지그시 바라보는 ‘지긋하다·지긋이’에는 참하고 듬직한 자취가 흐릅니다. 지긋이 손을 놀려 그림을 이뤄요. 우리 이야기를 그림종이에 옮깁니다. 차근차근 일구는 삶을 고스란히 적바림하기에 삶글입니다. 대단한 길을 걸어왔기에 훌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기를 바랍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힘겹다 새벽에 마당에 내려설 적마다 하늘빛을 살핍니다. 바람 한 줄기를 마시면서 날씨를 읽습니다. 집에 보임틀(텔레비전)을 안 둘 뿐 아니라, 날씨알림을 안 듣습니다. 스스로 하늘숨을 마시고 읽으면 하루를 알 수 있어요. 해님은 날마다 우리한테 찾아듭니다. 때로는 구름이 폭 덮으면서 마치 햇살이 안 퍼지는 듯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빗줄기가 후두둑 쏟아지며 해가 없나 싶기도 하지만, 하늘은 늘 우리 숨결을 헤아리면서 새롭게 찾아와요. 고단한 날에는 하늘꽃을 그리면서 마당이나 풀밭에 드러누워 눈을 감으면 온몸에 기운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둘레에서 들풀이 한빛을 푸르게 베풀어요. 힘겨울 적에는 스스로 밝님이 되어 마음 가득 사랑을 길어올려요. 이웃이나 동무가 토닥이면서 도울 수 있되, 누구나 스스로 살리는 빛살로 천천히 쉬면서 버거운 무게를 씻을 만합니다. 빚을 졌다면 빛으로 갚으면 됩니다. 짐스러운 생각은 빛꽃 한 줄기로 다독이면서 털어낼 만해요. 밥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오늘말’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이 낱말 하나를 혀에 얹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가꾸어 보기를 바랍니다. 숲노래 우리말 오늘말. 후련하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홀가분히 ‘차(茶)’를 마시지만, 지난날에는 아무나 못 마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거리낌없이 살림을 꾸리며 혼잣길을 걸을 수 있되, 지난날에는 스스로 나래펴며 살아가지 못 했어요. 이제는 날개를 아무렇게나 짓밟으려는 막짓이 사그라들지요. 저마다 한바탕 바람꽃이 되어 훨훨 일어날 만한 터전입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우리 멋빛을 찾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풀잎이나 꽃잎이나 나뭇잎이나 나무꽃을 말려서 뜨뜻한 물에 우리는 물을 마시는 말미에 문득 생각합니다. 잎을 우리니 ‘잎물’일 테고, 잎물을 마시면서 숨을 돌리면 ‘잎물짬’처럼 새말을 놀이하듯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곁에서 마음껏 해바람비를 머금고 자란 풀꽃을 물 한 모금에 어떻게 풀어놓았나 하고 돌아봅니다. 후련하게 속을 씻듯 스미는 잎물은 들숲하고 하늘을 넘나드는 바람빛 같아요. 몸을 틔우면서 마음을 열어요. 우리길을 눈치를 안 보면서 가뿐히 활갯짓으로 나아가지요. 호젓이 앉아서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적' 없애야 말 된다 : 자주적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다 → 일을 스스로 풀다 자주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 내 나름대로 애쓰다 자주적 결정 → 혼길 / 혼넋 / 임자넋 자주적 외교 → 임자로 만남 / 스스로길 / 스스로서기 ‘자주적(自主的)’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스스로·몸소가다·스스로가다’나 ‘스스로길·스스로서기·시키지 않다’나 ‘임자·임자넋·임자얼·혼넋·혼얼’로 손봅니다. ‘저절로길·제 발로·호젓하다·홀가분하다’나 ‘혼자서다·홀로서다’로 손볼 만하고, ‘기꺼이·기껍다·서슴없다·선뜻·스스럼없다’나 ‘기운차다·기운넘치다·힘차다·힘넘치다’로 손봅니다. ‘나름대로·그 나름대로·제 나름대로·내 나름대로’나 ‘냉큼·닁큼·착·착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적' 없애야 말 된다 : 종교적 종교적 관점 → 믿는 눈 / 믿음눈 / 믿음길 종교적 갈등 → 믿음 다툼 종교적인 행사 → 믿음자리 / 거룩한 자리 ‘종교적(宗敎的)’은 “종교에 딸리거나 종교와 관련되는”을 가리킨다고 해요. ‘-적’을 뗀 ‘종교’만 쓸 수 있되, ‘믿음·믿다’나 ‘믿음빛·믿음길’로 손볼 만합니다. ‘거룩하다·높이다·받들다·섬기다·올리다·우러르다’로 손보거나 ‘절·절집·작은절·큰절’이나 ‘하늘빛·하늘길’로 손보아도 됩니다. ‘길·빛’이나 ‘빛길·온빛’으로 손볼 수도 있어요. ㅅㄴㄹ 바꾸어 말하면 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선 모든 철학적 신조나 종교적 신앙을 존중하고 → 바꾸어 말하면 겨레 테두리를 넘어선 모든 눈빛이나 믿음빛을 따르고 → 바꾸어 말하면 겨레 테두리를 넘어선 모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적' 없애야 말 된다 : 비공식적 비공식적 회담 → 뒷모임 / 살짝모임 / 속모임 비공식적 방문 → 슬쩍 왔다 / 조용히 왔다 / 슥 왔다 비공식적인 관계 → 몰래 사이 / 안 알려진 사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다 → 뒤에서 말하다 / 살그머니 말하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 뒷길로 일을 풀었다 ‘비공식(非公式)’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사로운 방식”을 가리키고, ‘비공식적(非公式的)’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사로운”을 가리킨다는군요. ‘뒤·뒷길·뒷구멍·뒷구녁’이나 ‘뒷놈·뒷장사·뒷팔이·뒷주머니’나 ‘몰래·몰래쓰다·몰래질·몰래짓·몰래일’로 손볼 만합니다. ‘검은구멍·까만구멍·깜구멍’이나 ‘검은길·까만길·깜길’로 손볼 수 있고, ‘그냥·그냥그냥·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겹말 손질 ㄱ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었다 →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다 → 두 손 들었다 → 손을 놓았다 자포자기(自暴自棄) :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 자기(自棄)·자포(自暴)·포기(暴棄) 더는 안 한다고 하기에 ‘그만두다’라 하고, ‘손놓다’라 합니다. “될 대로 되라”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보기글처럼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은 군더더기 가득한 겹말입니다. ‘자포자기’를 덜면 돼요. ‘팽개치다·내팽개치다’로 고쳐써도 어울립니다. 어차피 틀린 거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었다 → 뭐 틀렸으니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다 → 이제 틀렸으니 두 손 들었다 → 다 틀렸으니 내팽개쳤다 《당신의 사전》(김버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이레말’은 이레에 맞추어 일곱 가지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에 슬기롭고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내는 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레에 맞추어 다음처럼 이야기를 폅니다. 달날 - 의 . 불날 - 적 . 물날 - 한자말 . 나무날 - 영어 . 쇠날 - 사자성어 . 흙날 - 외마디 한자말 . 해날 - 겹말 숲노래 우리말 겹말 손질 ㄱ 축에 속하다 지식인 축에 속하는 → 글물 축인 → 먹물에 드는 → 글바치인 축 :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 속하다(屬-) : 관계되어 딸리다 우리말 ‘축’을 낱말책에서 살피면 ‘부류’로 풀이하는데, 다른 한자말로는 ‘소속·속하다’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글처럼 “(무슨) 축에 속하는”이라 하면 겹말이에요. “(무슨) 축인”으로 끊을 노릇입니다. 또는 ‘들다’란 우리말을 쓸 만하고, ‘-인’ 같은 토씨만 붙여도 어울립니다. ㅅㄴㄹ 그 연배에서는 지식인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 나이에서는 글물 축인 사람이었습니다 → 그 또래에서는 먹물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 둘레에서는 글바치인 사람이었습니다 《재일의 틈새에서》(김시종/윤여일 옮김, 돌베개, 2